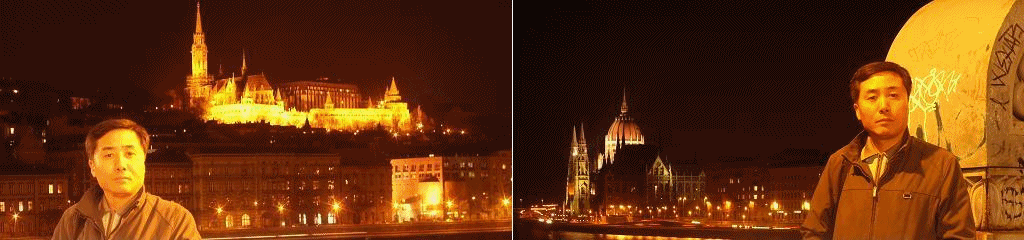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면
빨간 립스틱을 바르고
까만 스타킹에 아슬 아슬한 미니스커트
언제 까지 이런 생활을 계속 해야할까.
아직도 익숙치 않은 굽높은 구두
어제 취해서 비틀거리면서 돌아오다
삐끗한게 아직두 고통스럽다.
휴~ 한숨... 움... 누구지?
멀리서 어떤 꼬마애가 나를 멀뚱 멀뚱 바라본다.
췻! 짜식이 보는 눈은 있어 가지구
한번 피식 웃어 주고는 길을 나선다.
별들도 숨어버린 밤하늘
달 혼자 덩그란히 남겨서
오히려 더 처량해 보이는 밤
오늘도 비틀 비틀
나도 비틀 너도 비틀 세상도 비틀
어라? 그런데 조고 어서 많이본 물건인데
오라~ 아침에 본 그 꼬맹이로군
안녕~ 꼬마 늑대님~
너도 조금만 자라면
그들과 같아 지겠지~ 히힉~ 우~욱~ 웩~
툭~툭~ 작은 손이 내 등을 망치질한다.
전봇대를 움켜쥐고 주져 앉은 내 등뒤로
환한 달빛을 등진 꼬마 아이가 보인다.
" 넌 누구니?"
그냥 말없이 웃기만 하는 아이
머리가 아프다.
그놈의 술 아우~ 속이 쓰린다.
뭐라도 먹어야 할텐데
부시시한 모습으로 슬리퍼를
질질끌며 슈퍼로 향했다.
이것 저것 주섬 주섬 대충 집어들다가
문득 그 꼬마가 떠올랐다.
그런데 그 꼬마 그 늦은 시간에
그 곳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
오늘도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과자가 든 봉지를 들고 한참을 기다렸다.
하지만... 그 아인 오지 않았다.
그렇게 몇일이 지나고 오랜만에 휴일
목욕탕에 가려고 나오는데
멀리서 그 아이가 보인다.
왠지 많이 야위어 보이는 모습
수줍은듯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는 아이
그 아이에게 오라고 손짓하고는
전에 사두었던 과자 봉지를 쥐어주었다.
한사코 받지 않으려고 손을 뒤로 숨기는 아이
너무도 순진하고 귀여운 아이가
사랑스럽다라는 생각을 해본다.
" 집이 어디야? "
말없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은
언덕위에 있는 작은 성당
아마도 고아인가
" 누나 목욕가야 하는데 같이갈래? "
농담으로 던진 한마디
놀란듯이 눈이 똥그래진채
고개를 젓는 아이가 너무 귀엽다.
" 그래... 그럼 안녕~ 담에 또 보자~ "
멀어지는 내 모습을 바라보는
그 아이의 눈빛이 슬퍼
보이는건 내 착각일까?
다음날 밤이 다가오는 시각
역시 그 아이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은 무엇인가 할말이 있는듯
내 앞에서 우물 쭈물 거린다.
" 음... 누나한테 할말 있니?
누나 지금 바쁘거든? 빨리 말해줄래? "
잠시 결심을 한듯
결의에 찬 얼굴 표정을 짓고는
알수 없는 손짓을 해덴다.
어디선가 많이 본 손짓들
" 그게 뭐야? 누나 모르겠다. 그게 뭔지 "
열심히 한 자기의 행동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울분일까?
아이가 울먹이기 시작한다.
그러다 처음으로
그 아이가 입을 열었다.
" 어버버... 버버.. "
오~ 신이시여
그 아인 끝네 울음을 터트렸고
나는 그저 그 아이를 안아주었을 뿐
어떤 말로도 어떻게도 해줄 수 없었다.
까만 밤하늘을 가득채운 검은 구름
그날 부터 퍼붓기 시작한
비는 끝내 장마가 되어 버렸다.
그 일이 있은후 그 아이를 볼수 없었다.
아마도 지겹게 내리는 이 비 때문이리라
비가 그치고 햇님이 얼굴을 내민지 벌써 5일째
어느샌가 나는 그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매일 아무 의미없이 흘러가던 시간들을
그 아이가 가득 체워준거 같은 그런 느낌
그리움 이란것도 기다림 이란것도
그렇게 이주가 지나가고
밤 늦게 돌아오는 그 골목에
그 아이가 서 있었다.
순간 난 뭔지 모를 뜨거운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을 느꼈다.
흘러 내리는 눈물을
닦아내며 간신히 건넨 한마디
" 아... 안녕? "
묻고 싶은게 머리속에 가득한데
아무말도 할수 없었다 아니 할수 없었다.
그 아이가 말을 못한다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 아이의 모습이
평범한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란 것을 느껴서일까.
너무나도 헬쓱해진 모습
" 어디 아프니? 이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거야? "
아이는 그저 웃기만 할뿐
대답하고 싶어도 아마 할수 없겠지
"자 누나가 바래다 줄께 어서 가자.
혼자 여기 있으면서 무섭지 않았어?"
내말에 그저 고개만 좌우로 돌리는 아이
뒤로 두 손을 숨긴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자 어서 집에 가야지
다들 걱정 하실거야 자 어서"
내가 내민 손을 물끄럼히 바라보눈 아이
그러다... 무엇인가를 내 손에 올리고는
뒤도 안돌아 보면서 달려간다.
훗!... 아픈건 아닌가 보구나
왠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쥐어준 그것을 보았다.
작은 도화지에 그려진 공주님의 그림
그리고 그 아래 꼬불거리는
글씨로 써진 몇마디의 말
" 누나는 공주님 같아요. "
그날 나는 달빛 아래서 한없이 울었다.
왜 그랬을까?
그냥 그 아이의 마음이
나를 슬프게 했다.
너무나도 순수한 마음이
오랜만에 들어보는 성당의 종소리
평소엔 그 소리에 잠에서 깨면 짜증만 났는데
왠일인지 너무나도 아름답게만 들려왔다.
그런데 평일에도 종소리를 들었던가?
이유는 알수 없었지만
한번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까운곳에 있으면서도
처음으로 가보는 성당
성당 옆쪽으로 아이들이 눈에 띄었다.
그 중에 그 아이도 있겠지
아마 내가 온걸 알면 그 아이가 놀래겠지?
그런데 왜 다들 두손에
하얀 꽃을 들고 있는걸까?
왜지? 왜?
" 저 무슨 도와드릴 일이라도 "
어느새 다가온 나이 많은 수녀님
" 아... 예... 그냥... 저...
그런데 무슨 일이 있나보죠? "
" 그러시군요 오늘 작은 생명 하나가
주님의 곁으로 떠났지요."
어?... 어?...
" 저... 혹시... 혹시... 말 못하던...
그... 그 아이? 아니겠죠?"
" 어떻게 아시죠? 혹시
'인연'이가 말하던 그 분이신가요? "
" '인연'... 그 아이의 이름이 '인연'인가요?"
" 예 불쌍한 아이죠
태어난지 얼마 안되서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지금까지 살아온게 기적이 라고
밖에 볼 수 없을 정도로
그 아인 심한 병을 앓고 있었답니다."
오~ 신이시여
바람이 불어와 어느샌가 흘러버린
내 볼의 눈물들을 떨구워간다.
" 이렇게 오신거...
그 아이 마지막 가는길 인사나 해주시지요."
작은 몸뚱이가
나무로 만든 관 속에 누워있다.
그 위로 친구들이 놓아준 꽃들이
그 아이에게 안녕 이라 말한다.
눈물이 흐른다.
더이상 나올 눈물 조차 남지 않을 만큼의 눈물이
멀리 떠나가는 그 아이를
뒤로하는 내게 수녀님께선 말씀해주셨다.
동화 책속에서만 보던 공주님을 보았다고
꿈속에서도 그리던 공주님을 보았다고
그 날 이후로
우울해 하기만 하던 아이가
활기를 찾았었다고
아마도 그 아인 행복한
꿈을 꾸면서 잠들었을 거라고
그날 이후 나는 화장을 하지 않았다.
더이상 짧은 치마도 입지 않았다.
더이상 추하게 살순 없었다.
그 아이가 밤하늘의
달빛이 되어 나를 지켜볼테니
말로만 듣던 어린 왕자란 책을 샀다.
늦게까지 일을 마치고
조금씩 읽기 시작한 그 책
아마도 내게 있어 그 아인 어린 왕자였나보다.
'▣잘 풀리는 가족문화 > ▶가정의 감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사랑을 칠하는 페인트공" (0) | 2008.12.13 |
|---|---|
| 나를 위해 사랑하지 마세요 (0) | 2008.12.13 |
| 꽃 도둑과 가위 (0) | 2008.12.12 |
| 알수없는 아름다움 (0) | 2008.12.12 |
| 어머니의 마음 (0) | 2008.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