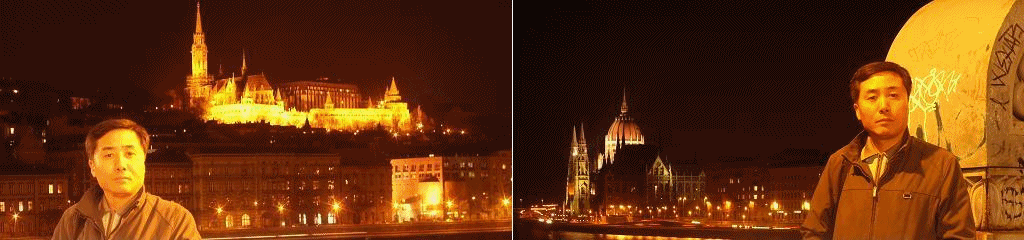야구공의 실밥매듭은 총 108개입니다.
이 매듭이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 변화구나 직구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수들이 시합중에 주심에게 공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에도 실밥이 마음에 안들거나
타자가 공을쳐서 실밥이 좀 찌그러져 원하는공을 던질수없다고 생각되어서 교체를 원하는 거에요.
또 투수들이 변화구 연습을할때엔 일반 정식시합야구공보다 더 굵은 실로 봉합된 연습구를 사용할때도 있는데
실이 더 굵을수록 공기의 흐름을 많이타서 그만큼 더 많이 변화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야구공은 108개의 실밥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야구공에 솔기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하는데요. 그 솔기의 중요한 역할중에 하나는 바로 스피드 입니다.
속도 차원에 있어서 솔기없는 야구공의 경우엔 대략 120~130km 정도가 빠른 공이라고 한다면
솔기있는 야구공의 경우는 140~160km 정도까지의 속력이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날아가는 거리도 매우 짧게 되는것이죠.~ 쉽게 말해서 투수의 입장에서는 빠르고 강한 공을 넣을 수
있고, 타자는 맞추어서 멀리 뻗는 홈런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솔기의 다른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은 바로 투수가 던질 때의 마찰의 증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직구, 변화구 등등에 있어서의 회전이란 측면에 영향을 줄 마찰이라는 점입니다.
즉 손가락과 공과의 마찰을 극대화 시켜서 회전을 좀 더 용이하게, 그리고 좀더 많이 할수있게 하는 것이죠.
야구공의 역사로 잠시 얘기를 하자면 야구가 처음 시작됐을 때 야구공의 크기는 지금과 똑같지 않았습니다.
1800년대 중반 야구공의 무게는 겨우 85g에 불과해서 무게가 가벼운 데다 녹인 고무를 가운데 넣고 털실을 감아
만들어 매우 탄성이 좋아서 경기를 벌이면 100점을 넘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합니다.
많은 점수때문에 1854년이 되면서 야구공은 조금 커지고 무거워 졌는데 무게는 155∼169g,지름은 7∼8.9㎝까지
허용되었고, 1859년 마침내 ‘원바운드 아웃’ 제도가 폐지되고, 1860년 크기가 조금 줄어든 야구공은 1872년에 와서야
현재와 같은 크기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한·미·일 3개국 프로야구를 비롯해 성인야구에서 쓰이는 공인구의 규격은 무게 141.7∼148.8g,둘레 22.9∼23.5㎝
(지름 7.23㎝) 이내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이 규격을 야구규칙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전에 각종 대회문제로 공인구 논란이 일어났을 때 한국야구위원회에서 150㎝ 높이에서 대리석 위에 공을 떨어뜨려
야구공의 탄성을 시험한적이 있었습니다. 50∼70㎝ 이내로 튀어 오르면 합격기준을 매겼었죠.
야구공의 생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탄성은 복원계수(Coeffience of restitution)에 의해 측정이
되는데, 지구상에서 만들어지는 공 가운데 복원계수가 1,즉 100% 다시 튀어 나오는 완벽한 탄력을
가진 공은 없다고 합니다. 야구공의 복원계수는 0.514∼0.578 사이여야만 정상이라고 볼 수 있다네요.
기준으로 볼 때 야구공의 속도가 원래 속도의 54.6%(오차 3.2%)가 되면 합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야구공에 약 30㎏의 압력을 가했을 때 0.2㎝ 이상 찌그러지지 않아야 됩니다.
둘레 23㎝, 무게 145g인 야구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 포수의 미트에 닿기까지 0.5초 안팎 찰나에 일으키는 변화는 현란하다.
투수판에서 홈플레이트까지의 거리는 18.44m. 실제로 공이 움직이는 거리는 그보다 짧은 17m 남짓이지만
그 공간에 도사리고 있는 무수한 변수가 야구의 묘미를 더해주는 것이다.
◇직선은 없다=흔히 말하는 직구(直球)는 본고장 미국에서는 ‘패스트(fast) 볼’이라고 부르며 종류도 다양하다.
직선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홈플레이트 앞에서 위·아래, 좌·우로 조금씩 꿈틀거리는 ‘변화구’다.
‘볼끝이 좋다 또는 살아있다’는 표현은 그 때문이다. 비밀은 공 표면의 가죽 2조각을 이어붙이는 108개의 실밥(seam)에 숨어있다.
실밥을 잡는 그립에 따라 구질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그립 포심(four seam)은 전통적인 직구를 던지는 방법이다. 실밥과 직각으로 검지와 중지를 걸치게 해
네 줄의 실밥이 공기저항을 받으며 날아간다. 강한 힘으로 역회전이 심하게 걸린 포심은 간혹 홈플레이트 앞에서
솟아오르기도 한다. 한때 박찬호(텍사스 레인저스)가 던졌던 시속 150㎞ 중반의 직구는 상당수가 ‘라이징 패스트볼’이었다.
투심(two seam) 패스트볼은 검지·중지를 실밥과 나란히 잡기 때문에 공기저항을 받는 실밥은 두 줄뿐이다.
홈플레이트 근처에서 약간 떨어지는 특징이 있다. 최근 박찬호의 직구는 포심에서 투심으로 바뀐 ‘싱킹 패스트볼’이다.
전보다 힘이 떨어졌다는 얘기.
투심과 같은 그립으로 잡지만 던질 때 중지에 힘을 주면 직구와 슬라이더의 중간인 컷 패스트볼이 된다.
투심보다 손가락의 간격을 넓혀 잡으면 스프릿 핑거 패스트볼. 스플리터 또는 SF볼, 반포크 등으로도 불린다.
국내 투수 중 정민태(현대)가 SF볼을 가장 잘 던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력과 회전=중력을 이용해 더 급격한 각을 그리며 떨어져 낙하하도록 던지는 것이 변화구(breaking ball)다.
그립은 물론이고 손목과 팔의 각도에 따라 다양한 브레이크를 만들어낸다. 브레이킹 볼의 대표적인 것이 커브.
‘예술’이라는 김원형과 최원호(LG)의 커브는 낙차가 커 타자 머리 높이를 향하는 것 같다가 홈플레이트 앞에서
무릎 쪽으로 뚝 떨어진다.
낙차로 말하자면 포크볼을 빼놓을 수 없다. 커브는 손목을 비틀어 던지는 반면 투심을 벌려쥔 그립 형태의 포크는
직구를 던지는 모습과 흡사하다. 노모 히데오(LA)는 포크볼 하나로 메이저리그 신인왕에 올랐고 국내에서는
김영수가 최고로 평가된다.
'▣자유게시판 > ▶자유게시판'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카페인 임신 억제 이유 밝혀졌다 (0) | 2011.05.26 |
|---|---|
| 인간 같은 이빨을 가진 물고기가 남미에서 잡혀 화제 (0) | 2011.05.19 |
| 특수 칫솔 "하루 한 번만 양치 하세요" (0) | 2011.05.05 |
| 치매 치료백신이 이르면 2~3년 안에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0) | 2011.04.26 |
| 백두산 지각판 내부 위치 마그마방 많아 폭발 땐 ‘지구 대재앙’ (0) | 2011.04.08 |